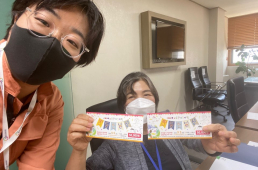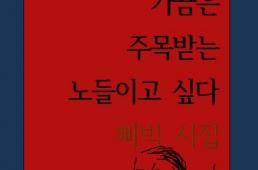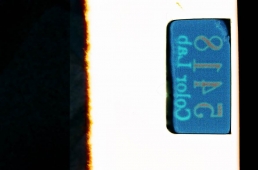1.
신길역 리프트기계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故 한경덕 씨를 기리며 서울교통공사의 공식사과와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에 함께 한 적 있다. 잠시 지하철을 멈추게 하고 요구사항을 전하고 있는데 한 50대 남성이 앉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하철 선로 밑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그 남성의 팔을 붙잡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럼, 나도 죽으면 되겠네. 나도 죽을까? 죽을까?” 선로 틈새 밑으로 다리를 집어넣고 빠지려는 시늉을 하는 것을 빼내 앉혔다. 아마도 그 사람은 시위가 단지 돈을 타내려는 행위처럼 여겨졌던 모양이다. 나는 지금도 온 몸으로 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던 그 남자를 생각하면 참 씁쓸해진다. 문득 명동의 카페 철거 반대 투쟁에서 들었던 말도 생각난다. 30명 남짓 용역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지도하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야, 쟤네들도 이거 먹으려고 들어온 거야. 뺏기면 쟤네들이 먹는 거야. 알겠어?” 더 이상 삶터가 아닌 곳. 돈과 땅을 빼앗고 가져오기 위한 전쟁터 속에서 죽음의 사연들이 눈에 보일까. 불평등은 불평등으로 보일까. 지하철이 잠시 멈춘 동안 한 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또 한 쪽에선 ‘쇼한다’는 욕설이 들렸다. ‘국회 앞으로 가라. 이건 아니지 않냐’는 짜증 섞인 소리도 들렸다. 얽히고 섥혀 터져 나오는 여러 소리들 속에서 관을 든 시위 일행은 다음 칸으로 이동했다.

2.
야학에서 한 학기 수업을 마쳤다. 김원영 변호사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읽었고 함께 글을 썼다. 한 학기 수업을 하고 내가 받은 것은 답답함이다. 불평등을 확인했다.
먼저 학생 분들의 말을 통해 알게 된 불평등이 있었다. 한 학생 분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장애를 갖게 되었고, 어떻게 야학을 찾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러다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나갔던 때를 말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나를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애인들은 모두 글을 읽을 줄 몰랐대요. 그런데 말도 잘하시고 해서 너무 놀랐대요.” 그 학생의 편견에 그렇게까지 놀랄 것 없었다.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었다. 학생 분은 인권 강의에서 장애에 대해 말할 수 있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돈 버는 기쁨보다 더한 것이라 했다. “도와주려고 할 때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도와주세요.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지 안 필요한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바로 이런 말을 할 때 였다. 이때 “장애인도 (당신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건낼 수 있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하셨다. 그러면서도 “오늘도 거리를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내 손을 막 붙잡는 거예요. 아우 화 나.”라고 말했다.
다른 학생 분들은 시설 안에서 자신이 들었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걔는 부모가 없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내보내주겠는데 너는 애기냐? 네 부모 생각 안하냐.” (..) “나가면 고기도 못 먹는다고 그랬어. 그때가 2011년인데. ‘또 나가면 약값은 있냐?’ 라고 했지. 동생은 ‘오빠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위험할 때 마다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지. 그땐 말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하려고. ‘위험하면 119 부르면 되지.’ 살다보면 누구나 위험한데 왜 나한테만 (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냐고.” (..) “‘나가면 뭐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성폭행 당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물었어요. ‘나가면 뭐 있어요? 나가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일하는 데 귀찮게 굴지 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 (...) “‘이렇게 청소해주는 사람 있으니까 여기서 살기 좋겠어요. 그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럼, 여기서 한 20년 동안 살아보실래요? 청소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비인권적 인식에 따른 폭력적 상황의 잦은 노출, 의료 지원 부족,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해 가족에게 생기는 부채감, 활동보조서비스 부족이 만드는 지역 사회 생활에서의 위험들. 여기가 바뀌어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한 개인에게, 개인의 장애에 전가되는 모습들이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정부가 주는 혜택의 수혜자인 것처럼 여기는 한 모습들이었다.

또 다른 학생 분은 상점에 경사로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비스 일종일지 몰라도 내겐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문제라고 했다. 경사로 하나는 자신에게 둥그런 거울을 살지, 네모난 거울을 살 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고 했다. 경사로가 없으면 나는 스스로 물건 하나 골라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했다. 음식점을 정할 때도 메뉴 선택이 아니라 경사로 유무로 판단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분은 자신의 좁은 선택을 넓히는 데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도 말했다. 나는 이 학생 분의 글을 통해서 경사로,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이러한 설치물들의 배치 유무는 하나의 기호이자, 하나의 목소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사로 유무는 ‘장애인이 여기서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고 ‘당신들은 여기서 함께 살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었다. 학생 분의 말을 듣고 지금 다시 거리를 둘러보니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는 목소리가 도처에 팽배했다. 만약 정부가 정말로 장애인이 탈 시설하여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곳에 ‘함께 살 수 있다’는 목소리의 기호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지금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말하고 있는 데 제발 활동보조 시간을 가지고 패를 가르고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고 부모 나이도 많아지고 있는데 활동보조 24시간이 지급되어 자신도 자립을 하고, 부모도 평생 돌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편 나는 학생 분들의 말 속에서 뿐 아니라 이들의 다양한 시도들을 보았을 때 역시 불평등을 느꼈다. 수업 막바지에 이르러 나는 ‘자, 이제 몇 주간 책을 함께 읽었으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를 써온) 분도 있었고, 말이 전달되기는 누구보다 어렵지만 누구보다 가장 먼저 뭔가를 해보자고 손 싸인을 보내 온 분도 있었다. 처음엔 망설이다가 쓰기를 조금 진행하고 나서는 수업 외에 따로 쓰는 시간을 더 갖자고 한 분도 있었다. 주말에 카톡으로 글을 보내 온 분들도 있었다. 알 수 없는 미소로 수업에 응답하는 분들도 있었고, 글을 쓰지 않았지만 끝까지 자리에 참여한 분들도 있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조는 분들도, 결석하는 분들도 많았다. 그러한 가운데 몇몇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나는 왜 이 분들이 교육현장에서 배제되어야 했을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가난을 이유로 일찌감치 시설에 들어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평등하다고 느꼈다. 비단 이번 수업 때만 느낀 것은 아니다. 지난 가을 노란들판의 꿈에서 나는 한 분이 AAC기계를 통해서 행사 사회를 보는 것을 봤다. 그 날 자리를 나설 때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었다. 어떤 노력들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구나 싶었던 때문이다. 나는 그때 시설이 정말로 불평등하다고 느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가난한 장애인들의 경우는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다양한 시도들에서 멀어지니 생계의 가능성에서도 일찌감치 멀어진다. 가족 내 부채감, 부족한 서비스 제도로 인해 생기는 불안과 위험을 개인에게 책임 전가하며 격리 생활로 몰고 있다. 편견은 그렇게 쌓여 가고 정부는 채무자를 대하듯 복지를 운영한다. 정부는 스스로가 뻔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이들에겐 불평등이 불평등으로 보이고 있을까.

 삐 빅 송 이 - 2019 부산 피플퍼스트, 아쉬움과 애틋함!
삐 빅 송 이 - 2019 부산 피플퍼스트, 아쉬움과 애틋함!
 삐빅 - 노들 일상 기억 02 (후원주점 이야기)
삐빅 - 노들 일상 기억 02 (후원주점 이야기)